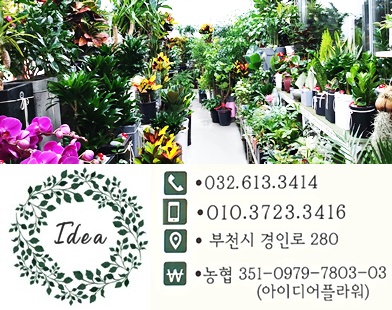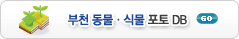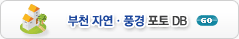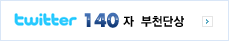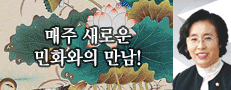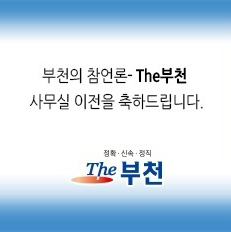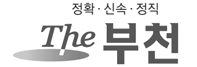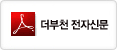원 의원은 특히 국내 2만여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북에 있는 가족에게 생계비를 송금하는 것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UN 등 국제기구에서 관심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현재 정확한 실태 파악은 안된 상황이지만 브로커를 통해 북에 남겨진 가족에게 연 150만~200만원 수준의 생계비를 송금하는 탈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탈북자들이 브로커를 통함에 따라 송금액의 50% 정도를 수수료로 떼이거나 제대로 가족에게 전달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이 국민 1천24명을 대상으로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생계비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물은 결과, 55.6%가 ‘가족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나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응답해 ‘생계비이긴 하지만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안된다’는 응답(44.4%)보다 많았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전달할 수 있도록 UN이 국제적인 창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선 71.5%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자 국내 거주기간 늘수록 北가족 걱정 커져
원혜영 의원은 또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과 공동으로 탈북자 319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6.6%가 ‘질병 상해’로 인한 어려움을 꼽았고,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25.8%),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17.3%), ‘문화적 차이’(15.5%), ‘교육기회의 문제’(14.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 상해’로 인한 어려움은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높았다. 1년이내(38.1%), 2~3년(25.6%), 4~5년(20.9%), 6년이상(15.8%)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은 국내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중가했다. 6년 이상(26.3%), 4~5년(17.9%), 2~3년(15.6%), 1년이내(11.1%) 순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탈북자 지원사업은 현재 통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만, 탈북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은 통일부가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하며 국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질병 상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가 많은 만큼 관련부처와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시기… 새터민 10년 이내 55.0%, 일반국민 20년 이상 65.3%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이 일반국민보다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는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0.8%(합산 55.0%)로 가장 많았고, 일반국민은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이 34.9%(합산 65.3%)로 가장 많았다.
| AD |
한국사회는 포용력 있는 사회… 국민 83.3%ㆍ탈북자 44.3%
한국사회의 ‘포용력’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 83.3%가 포용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탈북자는 44.3%에 그쳤다.
원 의원은 “이같은 차이는 새로 정착한 탈북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포용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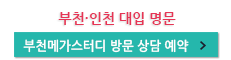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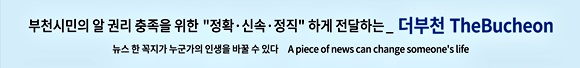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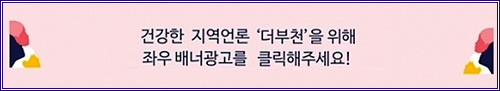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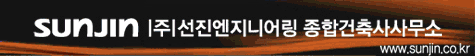



 박상현ㆍ이채명 경기도의원, ‘A..
박상현ㆍ이채명 경기도의원, ‘A.. 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
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시..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시.. 경기도의회, 영남지역 산불 피해..
경기도의회, 영남지역 산불 피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사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사회.. 박상현 경기도의원, 균형발전기획..
박상현 경기도의원, 균형발전기획.. 이재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
이재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